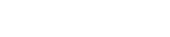릴게임주소 ㎍ 야마토5게임 기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5-09-13 19:14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63.rqc997.top
2회 연결
http://63.rqc997.top
2회 연결
-
 http://78.rka119.top
2회 연결
http://78.rka119.top
2회 연결
본문
PC파칭코 ㎍ 야마토창공 ㎍━ 97.rmq138.top →리더의 길에 빨간불이 켜질 때가 있다. 이 흔들림이 하나의 전환점이 되면 다행이지만, 누군가는 그대로 궤도를 이탈하기도 한다. 리더가 선로를 벗어나는 일, 리더십의 세계에서는 이를 ‘리더십 탈선’이라 부른다.
우리는 흔히 좋은 리더십에 대해 자주 말한다. 푸른 신호등과 매끈하게 닦인 도로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데 이건 그 반대다. 리더십 탈선이란 리더가 넘지 말아야 할 정지선을 뜻한다.
막 리더가 된 이들은 대개 야망 있고, 똑똑하며, 가능성으로 반짝인다. 세계적인 리더십 연구기관 CCL도 실패한 리더와 끝까지 살아남은 리더의 출발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두 리더를 가르는 건 ‘무엇을 더 갖추었냐’가 아니라, ‘무엇을 차상위계층 조건 넘지 않았냐’다. 넘지 말아야 할 선 앞에서 멈춰 설 수 있는 힘, 그 힘이 리더를 지켜낸다.
리더의 탈선은 결핍보다 과잉에서 온다. 자신감이 도를 넘으면 오만이 되고, 책임감은 집착으로, 추진력은 충동으로 뒤틀린다. 강점이 일그러졌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 또 다른 자화상인 것이다. 그래서 리더의 탈선은 하루아침에 카드대환대출 갑자기 발생하지 않는다. 리더가 밝은 면에만 집착할 때, 반대편 어딘가에서 조용히 자라난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리더 내면의 ‘다크 사이드’라 부른다. 평소엔 얌전히 숨어 있다가 결정적 순간에 발톱을 세운다. 은밀하고 익숙해 위험하다는 생각조차 못할 때, 리더를 뿌리째 흔든다.
대출통합 # 확신이 만든 벽 '과신'
자신감은 리더의 든든한 무기다. 그런데 이 무기가 ‘내 말만 정답’이라는 생각으로 굳어질 때 오만의 벽이 세워진다. 팀원의 목소리는 리더에게 닿기 전에 튕겨 나간다. 결국 모두 리더가 내놓은 정답 안으로 몸을 접는다.
과신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담당부서 내가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리더가 모든 걸 꿰뚫어보는 존재는 아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도 비슷한 말을 남겼다. “팀을 이끄는 사람이 가장 똑똑할 필요는 없다. 똑똑한 사람들을 믿고, 그들의 전문성을 존중할 수 있으면 된다.” 리더가 모든 채무 해답을 쥐고 있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이다. 아니, 오히려 ‘모른다’는 한마디가 팀을 움직이게 한다. 리더가 내려놓은 빈자리를 메우려 팀원들은 각자의 생각을 꺼내고 목소리를 보탠다. 결국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리더만이, ‘같이 생각하는 팀’을 만든다.
# 놓지 못하는 손 '통제욕'
보고서 폰트 크기, 회의 참석자와 자리 배치, 심지어 누가 먼저 입을 열게 할지도. 크고 작은 모든 걸 리더가 챙긴다. 처음엔 그 모습이 믿음직스럽다. 매끄럽고 정돈돼 보인다. 일이 착착 굴러갈 것만 같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회의실 공기는 눌러 붙는다. 오가는 건 리더 의중을 묻는 질문뿐이다.
어떤 리더는 말한다. “내가 없으면 이상하게 일이 안 돌아가요.” 얼핏 들으면 불타는 책임감처럼 들린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한 번도 놓아본 적 없는 불안이 녹아 있다. 크고 작은 결정을 모두 틀어쥔 손끝. 이 집요함이 흔히 말하는 ‘마이크로매니징’으로 이어진다.
하버드비즈니스스쿨의 한 연구진이 조사해보니, 직원 10명 중 6명은 이런 상사 밑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그 절반 이상이 의욕을 잃고, 일의 능률마저 떨어졌다. 실수 하나 막으려다 조직 전체를 병들게 한 셈이다.
모든 걸 움켜쥐려는 순간, 정작 놓치면 안되는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팀은 생기를 잃고, 열정은 식어간다. 중요한 건 ‘리더 없이도 문제없이 굴러가는 팀’을 만드는 일이다. 모든 걸 틀어쥐는 대신, 믿고 맡기는 것. 그게 리더와 팀을 단단하게 이어준다.
# ‘다음’만 향하는 시선 '충동 과잉'
새로움에 눈이 반짝이는 리더들이 있다. 트렌드에 민감하고 변화의 바람을 재빨리 감지하는 데 능하다. 그래서 늘 ‘다음’을 말한다. 다음의 기회, 다음의 방향, 다음의 전략. 문제는 그 ‘다음’이 너무 자주, 빠르게 찾아온다는 데 있다.
충동은 결단력의 먼 친척쯤 된다. 얼핏 보면 구분이 안 간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결이 다르다. 결단력은 숙고 끝에 나오는 단호함이다. 반면 충동은 기분이 먼저 튀어나가는 움직임이다. 그런 결정은 전략이라기보다 즉석에서 나온 아이디어에 가깝다.
이런 리더에게 붙는 이름표가 있다: ‘신상 증후군(Shiny Object Syndrome)’. 반짝이는 게 시야에 들어오면 일단 달려드는 습성이다. 그런데 매번 새로움만 좇다 보면 조직은 중심을 잃는다.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방향이 바뀌고, 실행은 뒷전이다. 모든 시선이 '지금'과 '여기'에만 쏠린다.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남는 건 배움도, 성과도 아닌 변덕스러운 궤적 뿐이다.
필요한 것은 시스템이다. 아이디어의 타당성을 차근차근 살피는 절차, 방향을 틀기 전 확인할 목록, 실행 직전 거치는 짧은 회의. 이런 장치가 순간의 반짝임에 조직이 휩쓸리지 않도록 지켜준다.
여기에 더해 리더는 자신만의 안전핀을 마련해야 한다. 가까이서 아이디어의 필요성을 짚어주는 팀원, 다음 기회에 다시 검토하자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팀 문화. 결국 조직을 지키는 건 강철 같은 리더의 의지가 아니다. 충동을 부드럽게 다루는 팀워크다.
# 결정을 미루는 마음 '자기 의심'
“다 같이 한번 더 검토해보죠”라는 말을 습관처럼 꺼내는 리더가 있다. 그런데 다음 회의에서도, 그 다음 회의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한다. 재생 버튼이 눌린 듯 문장은 그대로인데 결론이 없다. 다 함께 고민하자는 말 뒤엔 틀릴까 봐, 실패할까 봐,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은근히 깔려 있다.
해법은 ‘완벽’이 아니라 ‘시작’을 택하는 데 있다. 일단 실행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고치는 작은 한걸음이 필요하다. 그 움직임이 성취를 만들고, 성취는 신뢰를 키운다. 그리고 신뢰는 곧 다음 결정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든다.
머릿속이 복잡할 땐 결정을 쪼개는 것도 방법이다. 큰 산을 한 번에 오르려면 숨이 차지만, 능선을 나눠 가면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오늘은 방향만, 내일은 방법만, 모레는 시기만 정하는 식이다. 결정을 잘게 나누면 그 틈새로 단단한 용기가 스며든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건 불안이 나를 몰아세우기 전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자신감, 책임감, 결단력, 성찰. 한때 이런 것들은 리더의 믿음직한 무기였다. 그러나 도가 지나치면 자신감은 오만으로, 책임감은 통제로, 결단력은 충동으로, 성찰은 자기 부정으로 뒤틀린다.
리더는 하루아침에 탈선하지 않는다. 작은 방심 하나가 서서히 금을 낸다. 그래서 리더에겐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필요하다. 나는 언제 흔들리는가? 어떤 상황에서 불안해지는가? 리더십 진단이어도 좋고, 익명의 피드백이어도 좋다. 때론 지나가듯 던져진 한마디로도 충분하다. 그 말 하나를 마음에 새겨두자.
리더는 선로 위 열차를 닮았다. 흔들리면 중심을 잡고, 기울면 다시 궤도를 찾아야 한다. 실패에서 배우는 사람만이 끝까지 갈 수 있다. 결국 끝까지 달리는 건 완벽한 리더가 아니라, 흔들림을 딛고 균형을 되찾는 리더다.
김주수 휴넷L&D연구원장
우리는 흔히 좋은 리더십에 대해 자주 말한다. 푸른 신호등과 매끈하게 닦인 도로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데 이건 그 반대다. 리더십 탈선이란 리더가 넘지 말아야 할 정지선을 뜻한다.
막 리더가 된 이들은 대개 야망 있고, 똑똑하며, 가능성으로 반짝인다. 세계적인 리더십 연구기관 CCL도 실패한 리더와 끝까지 살아남은 리더의 출발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두 리더를 가르는 건 ‘무엇을 더 갖추었냐’가 아니라, ‘무엇을 차상위계층 조건 넘지 않았냐’다. 넘지 말아야 할 선 앞에서 멈춰 설 수 있는 힘, 그 힘이 리더를 지켜낸다.
리더의 탈선은 결핍보다 과잉에서 온다. 자신감이 도를 넘으면 오만이 되고, 책임감은 집착으로, 추진력은 충동으로 뒤틀린다. 강점이 일그러졌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 또 다른 자화상인 것이다. 그래서 리더의 탈선은 하루아침에 카드대환대출 갑자기 발생하지 않는다. 리더가 밝은 면에만 집착할 때, 반대편 어딘가에서 조용히 자라난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리더 내면의 ‘다크 사이드’라 부른다. 평소엔 얌전히 숨어 있다가 결정적 순간에 발톱을 세운다. 은밀하고 익숙해 위험하다는 생각조차 못할 때, 리더를 뿌리째 흔든다.
대출통합 # 확신이 만든 벽 '과신'
자신감은 리더의 든든한 무기다. 그런데 이 무기가 ‘내 말만 정답’이라는 생각으로 굳어질 때 오만의 벽이 세워진다. 팀원의 목소리는 리더에게 닿기 전에 튕겨 나간다. 결국 모두 리더가 내놓은 정답 안으로 몸을 접는다.
과신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담당부서 내가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리더가 모든 걸 꿰뚫어보는 존재는 아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도 비슷한 말을 남겼다. “팀을 이끄는 사람이 가장 똑똑할 필요는 없다. 똑똑한 사람들을 믿고, 그들의 전문성을 존중할 수 있으면 된다.” 리더가 모든 채무 해답을 쥐고 있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이다. 아니, 오히려 ‘모른다’는 한마디가 팀을 움직이게 한다. 리더가 내려놓은 빈자리를 메우려 팀원들은 각자의 생각을 꺼내고 목소리를 보탠다. 결국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리더만이, ‘같이 생각하는 팀’을 만든다.
# 놓지 못하는 손 '통제욕'
보고서 폰트 크기, 회의 참석자와 자리 배치, 심지어 누가 먼저 입을 열게 할지도. 크고 작은 모든 걸 리더가 챙긴다. 처음엔 그 모습이 믿음직스럽다. 매끄럽고 정돈돼 보인다. 일이 착착 굴러갈 것만 같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회의실 공기는 눌러 붙는다. 오가는 건 리더 의중을 묻는 질문뿐이다.
어떤 리더는 말한다. “내가 없으면 이상하게 일이 안 돌아가요.” 얼핏 들으면 불타는 책임감처럼 들린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한 번도 놓아본 적 없는 불안이 녹아 있다. 크고 작은 결정을 모두 틀어쥔 손끝. 이 집요함이 흔히 말하는 ‘마이크로매니징’으로 이어진다.
하버드비즈니스스쿨의 한 연구진이 조사해보니, 직원 10명 중 6명은 이런 상사 밑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그 절반 이상이 의욕을 잃고, 일의 능률마저 떨어졌다. 실수 하나 막으려다 조직 전체를 병들게 한 셈이다.
모든 걸 움켜쥐려는 순간, 정작 놓치면 안되는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팀은 생기를 잃고, 열정은 식어간다. 중요한 건 ‘리더 없이도 문제없이 굴러가는 팀’을 만드는 일이다. 모든 걸 틀어쥐는 대신, 믿고 맡기는 것. 그게 리더와 팀을 단단하게 이어준다.
# ‘다음’만 향하는 시선 '충동 과잉'
새로움에 눈이 반짝이는 리더들이 있다. 트렌드에 민감하고 변화의 바람을 재빨리 감지하는 데 능하다. 그래서 늘 ‘다음’을 말한다. 다음의 기회, 다음의 방향, 다음의 전략. 문제는 그 ‘다음’이 너무 자주, 빠르게 찾아온다는 데 있다.
충동은 결단력의 먼 친척쯤 된다. 얼핏 보면 구분이 안 간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결이 다르다. 결단력은 숙고 끝에 나오는 단호함이다. 반면 충동은 기분이 먼저 튀어나가는 움직임이다. 그런 결정은 전략이라기보다 즉석에서 나온 아이디어에 가깝다.
이런 리더에게 붙는 이름표가 있다: ‘신상 증후군(Shiny Object Syndrome)’. 반짝이는 게 시야에 들어오면 일단 달려드는 습성이다. 그런데 매번 새로움만 좇다 보면 조직은 중심을 잃는다.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방향이 바뀌고, 실행은 뒷전이다. 모든 시선이 '지금'과 '여기'에만 쏠린다.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남는 건 배움도, 성과도 아닌 변덕스러운 궤적 뿐이다.
필요한 것은 시스템이다. 아이디어의 타당성을 차근차근 살피는 절차, 방향을 틀기 전 확인할 목록, 실행 직전 거치는 짧은 회의. 이런 장치가 순간의 반짝임에 조직이 휩쓸리지 않도록 지켜준다.
여기에 더해 리더는 자신만의 안전핀을 마련해야 한다. 가까이서 아이디어의 필요성을 짚어주는 팀원, 다음 기회에 다시 검토하자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팀 문화. 결국 조직을 지키는 건 강철 같은 리더의 의지가 아니다. 충동을 부드럽게 다루는 팀워크다.
# 결정을 미루는 마음 '자기 의심'
“다 같이 한번 더 검토해보죠”라는 말을 습관처럼 꺼내는 리더가 있다. 그런데 다음 회의에서도, 그 다음 회의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한다. 재생 버튼이 눌린 듯 문장은 그대로인데 결론이 없다. 다 함께 고민하자는 말 뒤엔 틀릴까 봐, 실패할까 봐,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은근히 깔려 있다.
해법은 ‘완벽’이 아니라 ‘시작’을 택하는 데 있다. 일단 실행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고치는 작은 한걸음이 필요하다. 그 움직임이 성취를 만들고, 성취는 신뢰를 키운다. 그리고 신뢰는 곧 다음 결정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든다.
머릿속이 복잡할 땐 결정을 쪼개는 것도 방법이다. 큰 산을 한 번에 오르려면 숨이 차지만, 능선을 나눠 가면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오늘은 방향만, 내일은 방법만, 모레는 시기만 정하는 식이다. 결정을 잘게 나누면 그 틈새로 단단한 용기가 스며든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건 불안이 나를 몰아세우기 전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자신감, 책임감, 결단력, 성찰. 한때 이런 것들은 리더의 믿음직한 무기였다. 그러나 도가 지나치면 자신감은 오만으로, 책임감은 통제로, 결단력은 충동으로, 성찰은 자기 부정으로 뒤틀린다.
리더는 하루아침에 탈선하지 않는다. 작은 방심 하나가 서서히 금을 낸다. 그래서 리더에겐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필요하다. 나는 언제 흔들리는가? 어떤 상황에서 불안해지는가? 리더십 진단이어도 좋고, 익명의 피드백이어도 좋다. 때론 지나가듯 던져진 한마디로도 충분하다. 그 말 하나를 마음에 새겨두자.
리더는 선로 위 열차를 닮았다. 흔들리면 중심을 잡고, 기울면 다시 궤도를 찾아야 한다. 실패에서 배우는 사람만이 끝까지 갈 수 있다. 결국 끝까지 달리는 건 완벽한 리더가 아니라, 흔들림을 딛고 균형을 되찾는 리더다.
김주수 휴넷L&D연구원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